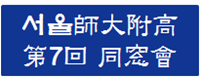이제 절기는 입춘. 그다지 춥지 않던 겨울 .... 그래도 마지막 체면을 유지 할려는 듯 요 몇일 기온은 영하권을 쓰윽 벗어나 우리의 어깨를 움추리게 하며 추위를 과시하고 있다. 오늘은 전형적인 흐릿한 봄 날씨 속에 춘설이 분분하다. 하이얀 눈 송이송이마다 새의 날개 속 깃털을 단듯 무한한 창공에서 선회하며 내려 앉을듯 하다 다시 솟구쳐 오르듯 날다가 사푼히 내려 앉는다. 아무래도 봄기운이 땅속에서 솟아 나오는 모양이다. *** *** *** 겨울 속의 봄이런가 코끝에 닿는 바람이 상큼하기까지 하다. 산길에 수북히 떨어져 놓여진 낙엽이 그대로 제 모양이 유지된걸 보면 추운 겨울 날씨 관계로 산을 오른 사람이 드물었나 보다. 예전 같으면 땔감으로 갈키질 하여 몽땅 긁어 갔을 낙엽들이 그대로 쌓여있어 보는 이의 마음이 풍요럽다. 그러나 조그만 불씨라도 떨어지면 자칫 온산에 큰 불로 번지겠다는 생각에 미치니 조심스럽기 그지없다.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너무나 어려웠던 시절에는 산에 낙엽은 물론 땔감으로 생 솔가지도 모두 쳐내어 가서 산이 벌거숭이인 시절이 있었다. 최근에는 나무를 간벌(間伐)을 해서 베어 내어도 이를 땔감으로 쓰지 않으니 사철 산에 마냥 쌓여 있어서 산불이 나면 것 잡을수 없는 큰 불로 번지고 장마철에 한꺼번에 물에 쓸켜 내리면 물길이 막혀 큰 물 사태를 일으키기도 하여 커다란 문제로 야기 되기도 한다. 오솔 길 가까이에 맨 윗머리가 꺽여져 나간 상수리나무 맨 위쪽 썩은 나무둥치에 참새만이나 할까 한 딱따구리새가 숨어있는 벌래를 잡으려는 듯 딱딱 쪼느라고 우리가 가까이 가도 모르고 나무 찌꺼기를 흝어 내리면서 구멍을 열심히 쪼아 내고 있다. 그전에 드문 드문 보이던 다람쥐는 그림자도 보이지 않고 그 보다 덩치 큰 청솔모가 새알이나 이들을 다 잡아 먹었나 보다고 원망을 듣던 이놈들도 어이된 영문인지 요즈음은 눈에 띄지를 않는다. 그 덕에 요 자그마한 새들도 겨우 살아나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것 같고 어쩐지 요즈음은 각양 각색 새들의 소리가 부쩍 많아 진것 같다. 산에 산새 소리가 안 들리면 적막강산,물에 물고기가 없으면 그 물은 죽은 물로 간주되니 "자연이 살아야 인간도 산다"는 보통 귀에 건성 들어 넘기던 표어가 마음에 확 닿는 느낌으로 깨닫게 된다. 소나무 숲 밑을 지나니 상큼한 송진 냄새가 코끝을 스치고, 휘이익 스르르 소리내어 혹씨 청솔모나 다람쥐인가 하고 들러보니 떡갈나무 잎이 겨우내 낙엽이 안 지고 매어 달린 채 바람에 흩 날리며 내는 소리다. 간밤에 내린 비에 적당히 물기를 머금은 흙은 넉넉한 어머니의 마음같이 무엇이든 받아주고 덮어주겠다는 듯 포근하기만 하다. 아스팔트와 세멘트 바닥을 또박또박 소리를 내며 걷느라 피곤해진 우리네 마음과 발들이 모처럼 대지의 품에 돌아간듯 맨발로라도 걷고 푼 기분이다. 웅달진 곳엔 물이끼가 서서히 파란빛을 띄우고 무너져 내린 흙더미 사이로 새파랗게 머리를 내민 풀들이 이미 봄이 와 있다는 걸 알려준다. 2002년 1월 18일 14년 2월 8일     |

2014.02.08 10:37
흐릿한 봄 날씨 속에 춘설이 분분
조회 수 623 추천 수 68 댓글 0
|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 7032 | 희망은 낯설지 않은 것입니다 / 장영희 | 김 혁 | 2008.12.26 | 675 |
| 7031 | 희망에게 / 이해인 | 김 혁 | 2014.01.04 | 601 |
| 7030 | 희 망 | 김 혁 | 2010.02.08 | 632 |
| 7029 | 흥겨운 풍악단으로 즐거운 추석 쇠시기를 빕니다 2 | 이웅진 | 2007.09.24 | 965 |
| 7028 | 흙밭과 마음밭 | 김 혁 | 2009.07.29 | 591 |
| 7027 | 흘러만가는 세월 | 박현숙 | 2008.11.15 | 661 |
| 7026 | 흘러만 가는 강물같은 세월 / 용혜원 | 김 혁 | 2010.11.13 | 548 |
| 7025 | 흘러만 가는 강물같은 세월 | 김 혁 | 2007.06.02 | 1004 |
| 7024 | 흘러드는 빛의 감동 | 미강 | 2007.11.23 | 904 |
| 7023 | 흘러가니 아름답네 | 김 혁 | 2016.11.27 | 984 |
| 7022 | 흔한것이 귀한것 | 미강 | 2011.04.12 | 563 |
| 7021 | 흔한것이 귀하다 | 미강 | 2010.03.16 | 620 |
| 7020 | 흔들리며 사는 것이 인생이다 | 김 혁 | 2015.06.29 | 769 |
| 7019 | 흔들리는 당신을 위한 편지 | 김 혁 | 2010.03.27 | 561 |
| 7018 | 흔들리는 것이 사랑이다 / 희망 박숙인 | 김 혁 | 2012.04.03 | 544 |
| 7017 | 흔들리기 / 月村 김환식 | 김 혁 | 2011.05.10 | 576 |
| 7016 | 흐트러진 자신을~~~ 1 | 미강 | 2008.03.14 | 821 |
| 7015 | 흐릿한 봄 날씨 속에 춘설이 분분(紛紛)... | 이용분 | 2016.02.18 | 737 |
| » | 흐릿한 봄 날씨 속에 춘설이 분분 | 이용분 | 2014.02.08 | 623 |
| 7013 | 흐르는강물 | 미강 | 2007.12.14 | 800 |